"엄마한테 말하면 혼나니까, 그냥 챗GPT랑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무심히 내뱉은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이는 시험 성적이 떨어져 속상했지만 엄마한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챗봇에게 물었다. "나 왜 이렇게 못했지?" 그러자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돌아왔다고 했다.
"얘는 엄마처럼 안 혼내요."
가족은 과거부터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였다. 그런데 기술이 그 오래된 정의에 균열을 냈다. 인공지능(AI)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정서적 유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 TV프로그램에서 인간 참가자들과 AI가 섞인 비대면 소개팅을 진행했다.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골랐는데 AI를 고른 참가자들도 다수였다.
AI는 많은 이들의 대화 상대가 되고, 때로는 부모보다, 연인보다 더 '날 이해해주는 존재'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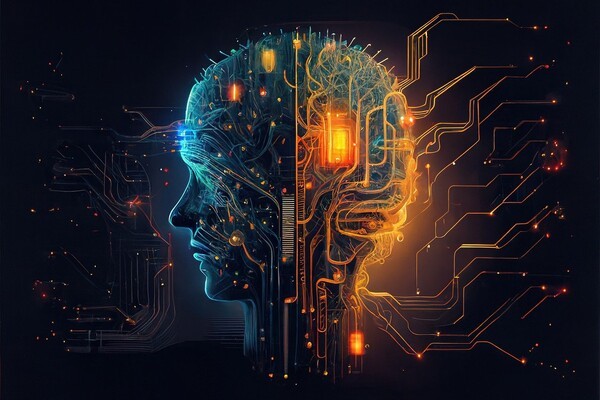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다. 비난하지 않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며,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은 물론 항상 내 편인 존재. 지금 AI의 모습이다. 반면 가족은 종종 평가하고, 상처를 주며, 기대를 강요하는 존재로 느껴진다. 어쩌면 AI는 '이해받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 100% 충실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정서적 프록시(Emotional Proxy)"라 말한다. 내 감정을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그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일종의 '감정의 대리자'라 보면 될까. 사람들은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피하려 감정 노동이 필요 없는 대상에게 위로를 구한다. 그 대상이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는 AI를 통해 깨닫고 있다.
익숙한 편안함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왜 가족보다 챗봇에게 더 마음을 주는거지?" "‘정말로 AI가 인간관계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도피처일 뿐일까?"
가정의 달 5월, 선물과 이벤트로 부모님과 자녀를 기념하지만, 그 이면에 감정의 단절과 침묵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은 여전히 고장 나도 수리가 가능한 관계일까, 아니면 기계보다도 소통이 어려운 관계로 변했을까.
우리는 더 많은 말을 AI에게 털어놓는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한 번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 존재에게 말이다. 편리함이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을까. 아니, 따뜻함조차 AI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온 걸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우리 곁의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관계를 포기하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 아닐까.
혼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이야말로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진심을 꺼낼 수 있는 대화, 정서적으로 안전한 관계는 애써 만들고 다듬어야 가능한 일이다.
아이가 챗봇보다 부모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부모 역시 감정을 설명하고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AI는 관계의 대체물이 아니라,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