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어린이날 맞이 지한유치원 방문···깜짝 마술쇼
2024-04-26
광화문광장 인근에는 300여대 경찰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문 채 차벽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인도 위 펜스까지 가세해 광장 전체는 물샐 틈 없이 봉쇄됐다. 인도를 걸을 때도 미로 형태로 세워진 펜스가 보행 속도를 늦추었으며 골목길에는 가벽까지 세워졌다.
뿐만 아니었다. 시위 참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90여 개 차량 검문소에서는 자동차 및 이륜차들이 돌아가야 했다. 도보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날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밝혀도 대부분 경찰 저지선을 통과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몰래 시위에 참가할지 모른다는 것이 현장에 나온 경찰들의 설명이었다.
창선파출소 앞에서 발이 묶여 있던 한 부부는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서 바이어와 중요한 계약 건이 있는데, 아침 9시에 인근 호텔에서 나와 3시간 째 목적지에 못 가고 있다”며 “지금 여기 현장에는 제대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책임질 만한 경찰이 없는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며 연락처 하나 주더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주목할 점은 취재를 목적으로 현장에 접근하려는 매체들에 대한 통제였다.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촬영을 하거나 촬영할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은 일단 제지부터 당했다. 취재라는 목적을 밝혀도 용인되지 않았다. 취재 통제의 근거를 묻는 본사 기자의 질문에는 관할 서에 문의를 하라거나 미리 취재 허가를 받고 왔어야 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자’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회에 등록된 기자는 소위 CP사, 쉽게 말해 이름이 알려진 큰 매체들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 운영되는 매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거나 신생 매체들은 취재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였다. 심지어 현장에서 ‘기자증’을 요구하는 모습도 몇 차례 볼 수 있었는데, 실제 협회 등록된 기자라 하더라도 취재 장소에 굳이 기자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흔치 않음을 보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이유를 위한 이유였다.
무엇보다 취재 통제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개인 유튜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종로경찰서의 정보과 모 팀장은 취재 통제를 항의하는 기자에게 “기자를 사칭한 개인 유튜버가 몰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으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매체들도 함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의 기자는 명함으로 매체 조회 후 광화문광장 근처까지 접근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현장에서 기자증까지 패용 중이던 다른 매체 기자는 끝내 원하던 취재를 하지 못했다.
취재 허가를 받고 교보문고를 지나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가는 동안도 여덟 차례나 경찰의 제지를 당해야 했다. 그때마다 담당자에게 허가 받은 사실을 대거나 그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제시하며 어렵사리 몇 백 미터를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높은 차벽과 펜스, 대형 화분 등에 둘러싸여 광화문광장은 가까이 가서도 육안으로나 카메라에나 전혀 담을 수 없었다. 높이 솟은 이순신 동상만이 그곳이 광장임을 말해 주고 있었다.
기자가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불편은 계속됐다. 지하철 광화문역과 시청역 모두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도를 이용해서 을지로입구역까지 걸어가야 했다. 역이 있는 명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역시 광화문광장 교통 통제의 영향으로 일부 차선을 막고 교통 요원들이 현장을 정리 중이었다.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가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나는 집회를 하는 것도, 막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8.15 집회 때는 영업 손실도 많이 봤다. 집회 하는 측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역시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지 너무 꽉 막으면 반발심이 생겨 더 심하게 하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지원 기자 news@smartf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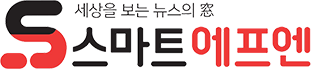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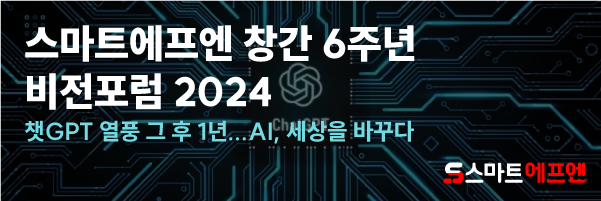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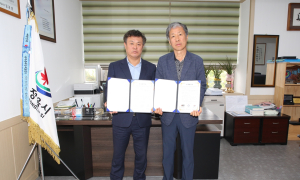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