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눈속임 조사…쿠팡 “전자상거래법 준수”
2024-05-17

지난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안. 경기도 화성시에서 토마토를 재배 중인 창업농 김모(29) 씨와 그의 친구 2인방을 만났다. 청년 창업농들이 실제 겪는 고충을 알리고 싶다는 취재 요청에서다. 김씨는 "최근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비료를 시비했는데 한 하우스의 토마토들이 집단 폐사했다"며 "빅데이터 자료가 실제 농업 환경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마트 팜 빅데이터는 농업인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쌓인 일종의 정보탑이다. 실제 농업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에 김씨에게 빅데이터 수치가 실제 토마토 비료 배합비랑 많이 달랐는지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그걸(배합비) 모르니까 스마트 팜을 도입한 것 아닐까요?"
김씨의 발언에 동업자 2인방은 그의 말이 옳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그 모습을 보곤 자리를 떠날 채비를 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창업농 명단에서 이미 빨간 줄이 '획' 그어졌다.
스마트 팜을 도입하면 농업의 기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스마트 팜이니 ICT(정보통신기술)니 해도 결국 이들을 최종 지휘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다.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계 설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뒷받침 되었을 때 스마트 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가정해보자. 빅데이터가 작물에 최적화된 비료 배합율을 알려줬다. 그런데 토양 내에는 이전에 시비한 비료 성분이 남아 있다. 이 때 비료를 시비할 경우 토양 내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작물 생육에 되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농장주의 지식을 토대로 작물과 토양 환경을 명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 농장주가 자신의 재배 작물에 대해 무지하면 스마트 팜은 결국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스마트 팜은 자신이 하기 싫은 농사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대행자' 느낌보다는 고된 업무를 덜어주는 '조력자'의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반대의 의미로 해석한 창업농이 귀농 길에 뛰어든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적지 않은 자금과 노력, 시간을 들여야 한다. 무작정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이킬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
'농사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1~2년 전부터 작물에 대한 공부와 성공적으로 수확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막연히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고됨을 회피하겠다는 마인드보다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할 지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이다.
윤종옥 기자 yoon@thekp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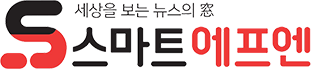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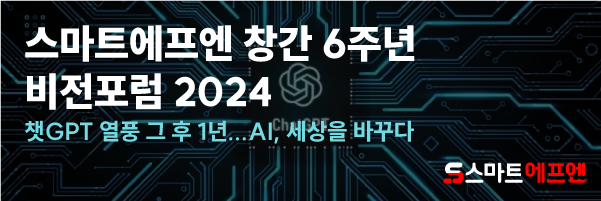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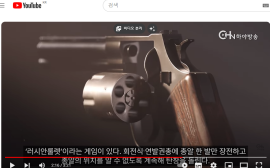












댓글
(0)